들어가며
2025년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다사다난했다. 증명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호기롭게 동료들과 시작한 예비 창업을 번듯한 스타트업으로 키워내거나, 혹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름대로 올해는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ㅋ
8월에 졸업장을 받기 전까지 내 생활의 전부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창고 같은 사무실이었다. 팀원들과 밤낮 가리지 않고 합숙하며 아이템을 깎아냈고, 부족한 운영비를 벌기 위해 외주를 뛰었다. 창업 패키지 서류를 채우기 위해 수십 장의 기획안을 함께 써내려가고, 대회라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보던 때였다.

호기로웠던
뭐좀되나 싶은 자신감으로 구체화해 나갔던 꿈은 결국 흩어지기 시작했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에 진작 찍었어야 할 마침표를 미루고 미뤘던 대가였을까.
매미들: 앙상하게 꿈꾸고 담담하게 녹슬어가던

"길 잃은 개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름밤"
2024년에 마침표를 찍었어야 할 대학 생활이 2025년 8월이 되어서야 끝났다. 남들은 사회로 나아가 제 몫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졸업 유예'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비 창업이라는 명분을 붙들고 1년을 더 보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안락함과 창업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 보낸 시간이었다.
동료들과 야심 차게 시작했던 도전은 20대의 화려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개같이 멸망이다. 팀이 공중분해되고 무너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아팠다. 단순히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밤을 지새우던 동료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지는 모습은 내게 도전했다는 성취감보다 처참한 패배감을 먼저 안겨주었다.
졸업장을 받아 든 8월 내 손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얻은 결과가 오직 '실패'뿐이라는 사실은 나를 극심한 조급함으로 몰아넣었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공포, 무언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삼키기 시작한 여름이었다.
서울: 지도에 없는 곳으로 떠난 길 잃은 취업

"지도에 없는 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선 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공포는 사람의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제대로 회사를 알아보고 커리어를 고민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어디든 소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듯 이력서를 뿌렸다.
그렇게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 조건만 대충 맞춰서 들어갔다. 관심도 없는 분야, 서칭조차 안 해본 회사. 그냥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 나를 던져 넣으면, 이 회색 도시에 일단 올라탄다면 조급함도 함께 씻겨 내려갈 줄 알았다.
하지만 지도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며 나선 길은 결국 미로였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매일 출근하는 것은 고역이었고, 담배 연기처럼 내 하루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서울은 나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모르는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거울이었다. 결국 나는 얼마 못 가 서울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Lester Burnham: 텅 빈 속과 최대치의 볼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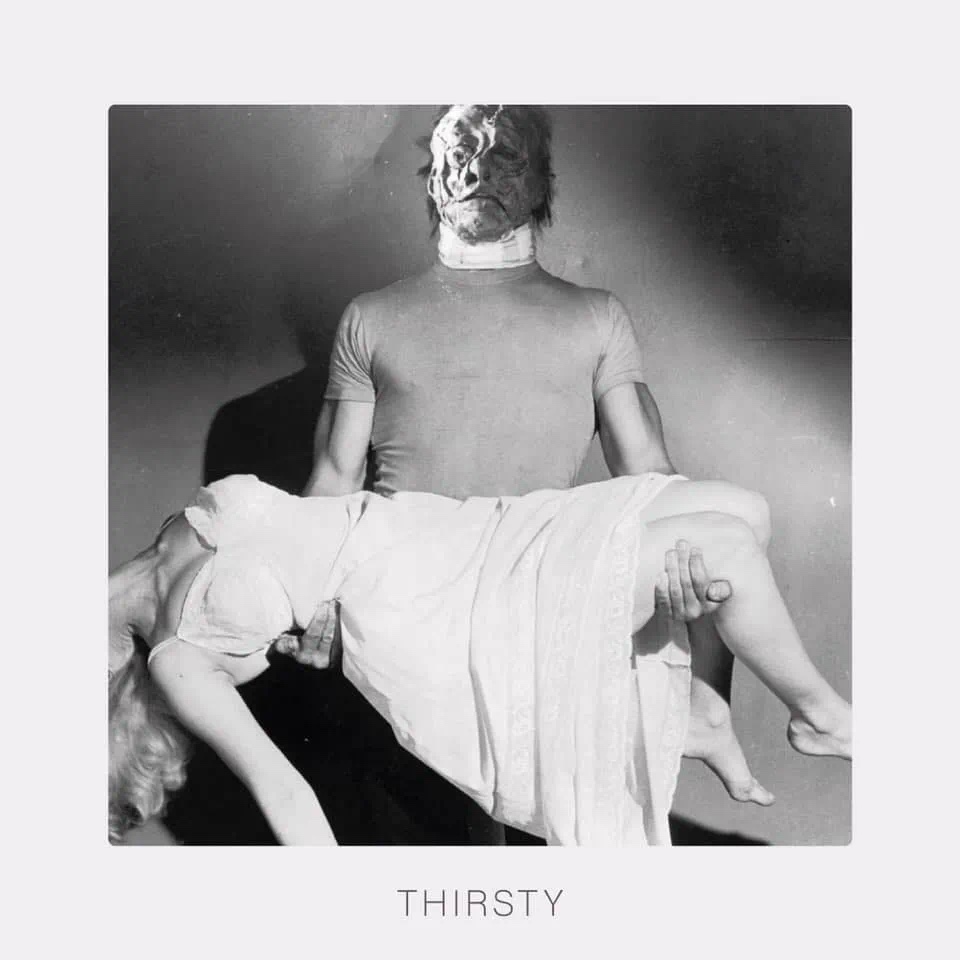
"괜찮아 거긴 원래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어"
서울에서 도망쳐 내려오며 나는 일렉 기타를 한 대 샀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사고 싶었다 ㅎㅎ.. 아무튼 일렉 기타는 평소 치던 어쿠스틱과는 생각보다 더 다른 느낌이었다.
어쿠스틱 기타는 따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치면 된다. 별다른 세팅 없이도 그 자체로 완성된 소리를 낸다. 하지만 일렉 기타는 달랐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앰프가 있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질감을 찾으려면 노브를 이리저리 돌리며 톤을 잡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득 취업도 일렉 기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합격이라는 줄을 튕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가 이 환경에 어울리는지, 내가 밟고 있는 설정들이 내가 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조율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서울에서의 나는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도 모른채로 그저 '서울 취업'이라는 노브만 무작정 최대치로 돌려버린 셈이다.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출력만 높였으니 귀를 찌르는 불협화음만 들렸고 나는 결국 그 소음이 무서워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요즘 연습하던 노래처럼 내 속은 사실 텅 비어 있었는데 겉으로만 소리를 내려고 애썼던 것은 아닐까. 일렉 기타를 사기 전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선 먼저 적절한 세팅 값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

야마하 퍼시피카 112j
입춘: 초라한 나를 꺾어 봄으로

"아슬히 고개 내민 내게"
결국 11월, 부산의 한 회사에 재취업을 했다. 누군가는 서울에서의 도망을 실패라고 부를지 모르지만(도망맞음),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세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전의 서울 생활에서 내가 배운 건 명확하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던져진 환경은 성장이 아니라 소모를 낳는다는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에너지를 허투루 쓰는 게 아닌, 나를 가장 잘 아는 익숙한 환경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튜닝임을 믿는다.
벽장 속을 벗어나 무대 위에 서는날까지. 2025년의 혼란스러웠던 소음은 이제 뒤로하고, 적토마의해인 2026년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